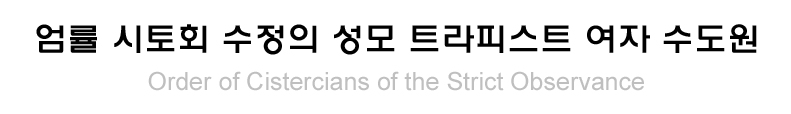너에게 닿는 길
너에게 닿는 길
너에게 가는 길
한참을 걷고 나서야
길 잃은 줄 알았어
뒤돌아봐도
돌아갈 길은
더 막막했지
햇살 바퀴 빨리 돌아
어둠보다 더 캄캄한 몸 끌고
길을 재촉하네
어둠 속에서
도움 청할 길도 없이
새로운 길을 가네
너에게 닿는 길
곧
나에게 이어지는 길
너에게 닿아
너 나를 외면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길
너에게 가는 길
한참을 걷고 나서야
길 잃은 줄 알았어
뒤돌아봐도
돌아갈 길은
더 막막했지
햇살 바퀴 빨리 돌아
어둠보다 더 캄캄한 몸 끌고
길을 재촉하네
어둠 속에서
도움 청할 길도 없이
새로운 길을 가네
너에게 닿는 길
곧
나에게 이어지는 길
너에게 닿아
너 나를 외면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길
어디선가 출렁출렁 강물이 흐른다
강물의 눈물
누군가의 가슴을 젹셔줄
노래일 수 있을까?
하염없이 흘러도
자신의 뺨 하나 적실뿐인
눈물도
콘크리트 벽 뚫고 나온 여린 노래
끊일 듯 이어지고
흐르는 둣 멈추는
여린 강줄기 하나
맘 속 깊은 곳 흐르네
메마른 가슴
적시며 흐르고파
여린 노래가 되어버린 눈물
강줄기 되어 가슴 깊은 곳 흐른다
깊디 깊이 푹 적셔줄 수 없는 안타까움
고작 자갈 돌 하나 감싸고 돌 때
여리디 여린 노래
누군가의 가슴에 닿고 있으리
새벽빛 어슴프레 밝아오고
저 멀리 닭 울음소리 들려온다.
새들도 풀벌레들도 깨어나
스르르 찌르르 뾰로롱 삐리리
합창을 한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 소리도
고요를 스치며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도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듯 함께
조용히 아침을 연다.
물레질 하듯 고요를 가르며
서서히 깨어나는
때 묻지 않은 아침의 소리
그 충만한 조화로움 속에서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을 만난다.
멀리서 새벽이 다가온다.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여명을 몰고 다가온다.
깨어 있는 파수꾼 세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흔들어 깨운다.
“일어나셔요, 그분이 오셔요!”
나는 한여름 소낙비가 참 좋다.
더위를 식혀 주어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경쾌하게 쏟아지는
그 난타 소리가 참 좋다.
그 소리는 내 심장을 흔들어대는 발자국 소리다.
심장 안으로 걸어 들어와
잠든 심장을 흔들어 깨우고
깨어난 심장을 걸어 나오게 하는 소리다.
그 소리가 향기를 낸다.
내 마음을 건드려서 향기를 낸다.
그분의 방문은 참으로 오묘하다.
불이 어둠 속으로
소리도 없이 들어와
시들고 분해되고 잘려나갈
온갖 것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란떠는 천둥 번개 아니고
하나하나 속속들이 또
통틀어 꿰뚫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둠의 발버둥은
점점 커지고
타오르는 불은 더욱 커져
굽고 꺾인 것들 위로
손을 폅니다
쇠진을 향해가는 힘 거세어질수록
불은 그것들의 중심을 떠받치고 지탱시키며
참생명 안으로
불이 온전히 자신을 삼켜
스스로 스러져감의 복됨을
맛보게 합니다
희디힌 포말로 부서지는
바다의 아픔
푸른 멍으로 부딪쳐오는
바위의 두려움
늘 부딪쳐도
늘 아픈
원망도, 아픔도, 두려움도
사랑의 다른 이름임을
깨달은
묵묵함 혹은 부서짐
부서져도
늘 푸른 바다
맞아도
늘 같은 바위
밀려올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타인을 치고
물러갈 수 없는 박힌 몸
타인의 뭇매에 몸을 맡기며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희디 흰 포말의
소멸
맞음도 때림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한 길
그 길 위에
함께 서있는 너와 나
죽음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을 넘어섭니다
사랑이
마지막 말이 될 때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한 자매가 걸어온다
또 한 자매가 마주 보며 걸어간다
점점 다가가네
비켜서지 않고
서로가
서로 안으로 걸어 들어가네
서로 관통하여
서로의 몸 안을 걸어
서로의 몸을 빠져나오네
뒤돌아
미소 한 번씩 나누고
제 갈 길 가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는데
사랑할 때조차
이기적인 우리
약도 없는
병에 걸렸나요
오직
님 현존 앞에
투명해지기를
주님의 호흡 속으로
들어가기를
경계없는 님의 사랑 안에
잠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