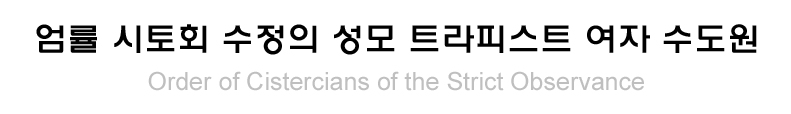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24년 4월의 말씀
부활
그 펄펄 살아있는 고요한 생명 앞에
수룩하고 시커먼 수염, 한방 맞으면 국물도 없을 것 같은 솥뚜껑 같은 손, 거구의 몸집 등 솔직히 이 그림 속 예수님의 모습은 산적 두목 같지요. 그런 예수님이 어울리지도 않게 온몸을 둥글게 구부려 암탉이 알을 품을 둥지가 되어주듯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옷자락 속에서 노란 병아리 한 마리가 엄마 품에서 나오듯 그렇게 나오고 있고, 어미 닭은 세상 안전한 둥지 속에 세상 편하게 병아리들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도 한 번 보지요. 둥글둥글 돌아가는 사막은 마치 어머니의 젖무덤 같고, 아기를 밴 엄마의 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젖무덤 사이를 수탉과 암탉이 여유롭게 배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사막 혹은 광야요, 유혹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암탉이며 병아리가 웬 말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말이 안되는 일일까요?
정말 사막에 머물러 본 사람은 그곳이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요, 새생명이 배태되는 곳임을 잘 압니다. 생명이 메말라, 생명이 바닥나서, 더 이상 유지할 도리가 없을 때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풍로로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찾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없는 곳, 생명과 반대의 상징인 곳 그곳으로 찾아드는 그 본능을 무어라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이 진정 바닥나있음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대면하지 못했던 그 참모습을 어떤 장식도 위로물도 없는 곳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은 생명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요, 주어지는 것임을 참으로 사무쳐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습니다. 어렴풋이 알던 것을 온몸 구석구석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명은 언제든 아낌없어 부어줄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은 바로 인간 안에 생명의 못자리 아기집이 생겨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막에서 무수한 암탉과 수탉 그리고 이미 그 아이들이 낳은 노란병아리들도 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기를 결코 멈추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 생명은 끊임없이, 아낌없이, 언제든 부어줄 준비가 되어있음을 누구보다 선명히 알고 계셨지요.
이런 이에게 사막은 이미 생명 풍성한 곳입니다. 오아시스를 애써 찾아야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막 어디서든 나타나는 곳입니다. 오아시스도 언젠가는 마를 수 있지만 이 생명은 세세대대로 결코 마르는 일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노란 병아리들 속에서 이미 감지한 예수님의 표정은 넉넉함이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쳐 그림을 보는 이 안으로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한 그림은 백이면 백 전부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붕 날아오르거나 무덤에서 나타나는 장면들이요 그마저도, 그림 전문 사이트에서 부활이란 주제로 검색을 해보면 몇 페이지 되지 않을 분량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주제 자체가 신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설명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특히 미술적인 시각 차원에서 묘사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차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요상한 세계는 또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뿌리로 하고 있고, 우리의 새생명은 현재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마술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 분명한 것은 죽음과 생명, 빛과 어둠, 황량함과 풍요로움, 고통과 기쁨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량한 사막에는 벌써 암탉 수탉이 알을 낳고 그 알은 부화하여 병아리를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에 생명이 뛰어놉니까? 광야라는 말에 마음이 설레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광야와 부활과 새생명이 당신의 마음 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부활이 함께 하는 곳에 무덤덤한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펄펄 살아있으니까요.
스탠리 스펜서, 광야에서 그리스도, 암탉,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