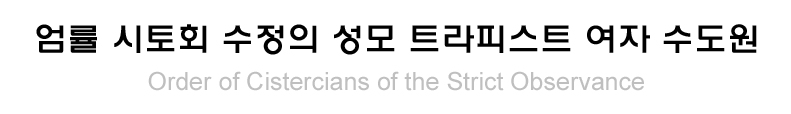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24년 3월의 말씀
어느 누구도 선과 악의
전문가는 아니랍니다
마음에 드는 예수님 얼굴을 만났습니다. 렘브란트의 시골 사람같은 예수님 얼굴 이후, 진짜 예수라면 이럴 것 같은 얼굴 모습을 처음 만났습니다. 푸근하고 인간적이면서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엄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많은 검은 머리에 아시아적인 얼굴이 편하게 다가오면서도 광야 속 예수라는 사실이 잘 느껴집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는 스탠리 스펜서라는 영국 사람이라 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 그림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작품일 것이라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봐왔던 그의 작품들과 결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다른 작품 그룹 사이 화가의 어떤 체험이 놓여있을까요? 알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지만, 그의 불행하달까 기묘하달까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결혼생활이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 만난 두 번째 부인은 동성애자였고 화가는 이 사실을 알고 결혼하였으며 심지어 결혼식 때 부인의 동성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을 정도였으니 그 관계가 참 상상이 잘되지 않습니다.
부인과 침실에서의 모습을 그린 두 명의 초상화는 그의 결혼생활이 어땠을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인과 자신 두 명 모두 나체이지만 이렇게 섹시하지 않은 나체 그림도 참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관람자 쪽으로 돌린 자신의 등은 마치 추위에 얼어붙은 듯 파리한 색깔로 묘사되어있지요. 남성으로서 침실에서 느꼈을 비참함이 그의 표정에서도 줄줄 흐릅니다. 그의 이런 삶이 광야에서의 예수 시리즈를 이렇게 독창적으로 표현하게 하는데 결정적 바탕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란 그야말로 인생의 반쪽을 만나는 일이니 그 반쪽과의 맞물림이 근본에서 틀어지면 그 삶의 모습이란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인가 봅니다.
예수의 표정은 깊은 슬픔과 함께 가슴 저미는 연민이 동시에 느껴지는 미묘함이 잘 잡혀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런 표정으로 뚫어지도록 바라보는 걸까요? 전갈입니다. 소중하고 또 소중하다는 듯 행여 떨어질까 살짝 오므린 손바닥 위에 전갈이 꼬리를 치켜들고 독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재롱이라도 부리나봅니다. 저리 꼬리를 들면 독을 쏘는 자세라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야 시리즈 다섯 가지 중 이 작품에서 예수의 표정이 가장 어둡고 연민 가득한 것은 아마도 전갈로 대표되는 인간세상의 어둠과 죄, 유혹 앞에 선 인간에 대한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는 전갈을 우리네처럼 혐오와 증오, 공포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 또한 하느님 아빠의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이 마치 고귀한 것을 대하는 듯한 손의 자세로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세상이 우리네처럼 둘로 쫙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모순되게도, 외부의 선과 악은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면서 자기 내면의 선과 악은 분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흐물흐물 섞여있는 묘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의 악에 대해서는 마치 선과 악의 전문가라도 되는 양 옳은 것 그른 것, 악인 선인을 쉽게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모습에서는 그런 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갈이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라 여긴다면 저리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없는 연민의 눈길로 바라볼 수는 없지요. 다른 한편, 저 깊은 슬픔을 보면 전갈이 지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의 힘을 모르는 바도 아님이 분명하지요. 인간 현실이 지닌 양면성과 인간존재의 이중성이 빚는 악의 요소는 분명 세상에 있고, 인간을 끝없이 유혹하지만 그것들을 무찌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창과 방패로 무장할수록 그것들은 더 교묘해지고 힘을 기를 뿐입니다. 유일한 길은 저 예수처럼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교 교부들에게서 계속 확인되며, 악은 희한하게도 이런 눈길 앞에서는 저 전갈처럼 맥을 못춥니다.
스탠리 스펜서, 광야에서 그리스도 전갈,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