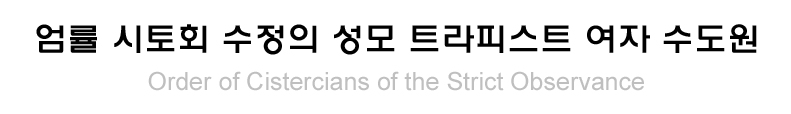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23년 6월의 말씀
절망, 그 새로움 그 오래됨
크의 그림은 일견 섬찟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왠지 친숙한 느낌을 주는 기묘한 매력을 뿜습니다. 결코 아름답다 할 수 없는 그의 그림들이 현대인들을 묘하게 잡아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법 합니다. 그의 그림들에는 한결같이 두려움, 공포, 불안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삶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이들의 연속적인 죽음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섯 살에 결핵으로 사망하고 13살 때는 누이가 같은 병으로 사망했으며, 여동생은 정신병에 걸렸고, 스물여섯에는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며, 서른두 살에는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꿰뚫고 지나간 그의 삶이 비참, 고독, 불안으로 관통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불안을 그림 속에 꾹꾹 담아냈습니다. 자살 충동도 있었을 것이요, 구불거리는 그림 속 선들처럼 늘 요동치는 자신의 형언할 길 없는 불안에 삼켜지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의 눈에 이 상황은 과장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주 현실감있게 느껴집니다. 듣는 것만으로 소름끼치는 그의 삶의 흐름 속에 그가 매몰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그림이라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과 함께 바로 여기에 그의 비극적 삶에 대한 이 시대를 위한 일종의 사명 같은 것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시대 역시 바로 불안과 고독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도 없었거니와, 지식의 차원에서도 만물의 바닥이라도 꿰뚫을 듯 속으로 파고들고 우주의 끝으로 날아가고 가장 작은 것들 속으로도 거침없이 들어가는 과학의 힘은 마치 신의 부재 내지 신의 다음 자리 정도는 인간이 충분히 차지 할 듯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내면의 불안과 존재의 고독 또한 이에 못지않게 모든 시대 가운데 최고를 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이제 감기 앓는 것이나 다름없이 취급됩니다. 예전과 달리 드문 현상으로 감추고 숨기려 들지 않는 것은 이제 누구나 그런 증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고 뭉크의 정신상태가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내면의 한 풍경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 역시 눈 수술을 하며 폐쇄공포증과 일시적 공황장애를 뼈 속 시리도록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인간은 진실로 하느님인지 아니면 에고로 똘똘 뭉친 자신인지를 선택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가 하느님 부재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도 아마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자신의 의지에만 의지하던 인간이 새로운 차원으로 즉 하느님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림에서 보면 하늘에는 붉은 불이, 땅에는 검은 늪이 가득 차 인간은 갈 곳조차 없어 좁디좁은 다리 위에 오밀조밀 밀쳐대며 맹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리 진 이들의 눈동자가 텅 비고, 눈 코 입도 뭉그러져, 형체들이 비슷한 좀비 무리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맨 앞쪽 여인의 눈만이 공포가 담겨있기는 하나 눈동자가 제대로 박혀 있으며, 정면을 응시하는 여인의 모습은 당당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환하게 제일 앞에 놓으면서도 마치 수수께끼처럼 심어놓은 여인은 절망의 바닥에서도 결코 스러지는 일이 없는 구원의 실자락 같이 느껴집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개인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스러질 수 없는 희망을 뭉크는 보여줍니다. 그의 그림은 깊이 볼수록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보고 그 두려움만 눈에 담은 후 돌아서면 결코 눈에 뜨이지 않는 숨겨놓은 그림찾기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뭉크, 불안, 1894, 94*74cm, 오슬로 뭉크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