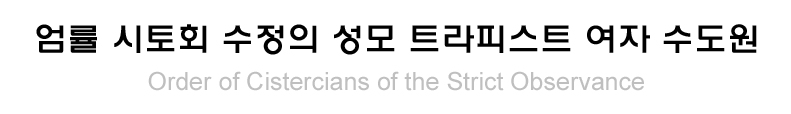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20년 4월의 말씀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창세 1,2) 있었던 그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들고 완성하셨습니다. “생명의 숨”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온갖 살아있는 피조물 속에 깃들어 빛이 생기고 땅에는 푸른 싹이 돋았습니다. 새롭게 하며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영, 성령께서는 빛이 생기기 전의 어두운 심연, 꼴이 갖추어지지 않은 죽음 같은 혼돈 또한 알고 계시는 증인이십니다.
고통 받는 시편 예언자는 통곡과 절망을 하느님께 쏟아냅니다. “저는 죽은 이들 사이에 버려져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들과 같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십니까? 무덤에서 당신의 자애가, 멸망의 나라에서 당신의 성실이, 어둠에서 당신의 기적이, 망각의 나라에서 당신의 의로움이 알려지겠습니까?”(시편 88). 그는 “어둠만이 저의 벗이 되었습니다.”는 말로 기도를 마칩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놓여있고, 아직도 슬프고,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죽음을 끌어안은 채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우리 믿는 이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흘 날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보다는 “저승에 가신”(사도 신경)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목숨이 저승에 다다라 주님의 손길에서 떨어져 나가”(시편 88)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바로 그 사람 곁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선포가 오히려 복음이 아닐까요? 저승에 내려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명 친히 저승문을 여시어 땅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듯, 하늘에서 번쩍 번개가 치듯 당신의 자애와 당신의 기적을 알리실 것입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에 일곱 번 시편으로 기도하는 우리 역시 “심연이 심연을 부르는” 크고 작은 죽음, 하느님으로부터 내팽개쳐지는 지독한 아픔을 직면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때에야 비로소 나 자신과 내 안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맡기고, 매달리며 온전히 의탁하게 되더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숨을 넘겨”(요한 19,30)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받는 제자의 깊은 울음과 만났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스승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없이 그저 머물며 인내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목격합니다. “바라봄”은 보호자 성령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남아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남아있겠다. 내가 너희의 고통 안에 남아있듯이 너희도 나의 죽음과 고통 안에 남아있으라.”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요한 19,34)은 우리의 눈물들을 거두어 모든 것을 되살리는 강이 되어 흐릅니다. 이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샘은 주님 안에 있도다.”
케테 콜비츠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