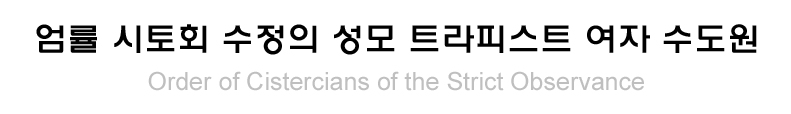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19년 7월의 말씀
그저 아름다운 이 아름다움이여!
절이 유난히 성큼성큼 앞질러 다가옵니다. 지난 봄날엔 산야초발효액을 담그기 위해 새순과 여린 야초(野草) 잎들을 뜯어 설탕에 재우고, 비누 재료로 사용할 어성초, 약쑥도 햇볕 잘 드는 곳에 두었더니 바람, 달빛, 별빛이 한 몫 거들어 잘 건조되었습니다. 바수고 고운체에 걸러 병에 담으니 넉넉합니다. 절로 신명나게 자라는 풀들이 참 고맙습니다. 봄날 아침, 수도원 경내를 다니며 채취하다보면 그저 걸음을 자꾸만 멈춥니다. 해 뜨면 사라질 이슬을 머금고 온전하게 충만히 하느님을 찬미하는 들풀과 함께 경탄하면서. 갈퀴나물에 벌레가 찾아오고 콩제비꽃이 하얀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면 야성(野性)을 잃지 않는 풀들은 곧장 숲을 이룹니다. 인간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는 한처음 하느님의 말씀을 땅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매실 수확 후 키위밭 풀베기를 하는 날, 돌멩이 하나 툭 튀어 오르더니 무릎을 때립니다. 덕분에, 베어진 풀더미를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키 큰 풀들 아래 숨어 있던 병풀잎이 싸한 향기로 얼굴을 건드리고, 바다를 굳혀 만든 하늘 귀퉁이의 구름자락이 나무 잎을 헤치고 내려오니 “주인”께 순종하는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경이로움이 덮치는 듯. 아주 잠시 땅과 나, 하늘이 어디론가 함께 빠져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풀도, 흙에서 난 사람도, 구름도. 그러나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희망 속에 사랑의 눈물 속에 우리의 시간 한가운데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풀, 흙, 사람, 하늘이 서로 서로 기대어 “우리”가 됩니다. 하나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무상(無常)은 없습니다. 무상의 정지, 감히 영원을 맛보게 해 주시는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실용의 등급’과는 상관없이 마냥 있어주어 고맙고 그저 아름다운 것들은 눈물을 품고 있습니다. ‘일곱 마귀가 나간 막달라 여자 마리아’(마르 16장)도 모든 다른 제자들처럼 실패한 예수님을 버리고(마르 14,50)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녀는 아름다운 사랑을 얻기 위해 빈 무덤이 있는 황량한 정원에 홀로 서 있습니다. 어두운 절망과 고독 속에서 흘리는 그녀의 눈물이 “닫힌 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일까요? “정원의 주인”(아가 5,1)께서 되살아나시어 “왜 우느냐?”고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빵을 부풀리는 누룩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하여 기뻐 외칩니다.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요한 20,18). 여름입니다. ‘필요의 논리’에 저항하며 몸의 노동을 묵묵히 행하는 이들의 등에 소금꽃이 피고 있습니다.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소금꽃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버림받아 밀려난 이들 가운데 당신 장막을 치십니다. 우리도 바로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 1638 런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