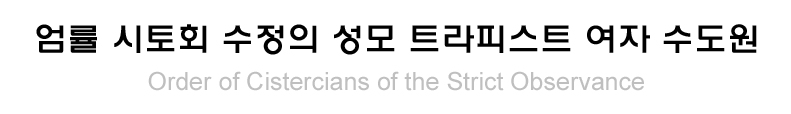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16년 11월의 말씀

마지막 길
음아,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라고 노래 부르고 싶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너어-허어허 너어-허어-허 너화 넘자 너어-허 만가 소리가 구불구불 배어나옵니다. 삭막한 겨울풍경, 푸른빛을 낼만한 것이라곤 소나무밖에 없는데 그 소나무마저 거의 검푸른 색입니다. 가을걷이 끝난 비탈 밭에는 마른 줄기 하나 남지 않았고, 바싹 마른 풀잎과 대지, 삭막한 바람마저도 멎어버린 초겨울의 풍경이 이상하게도 스산하질 않습니다.
구불거리는 밭길, 활처럼 휜 바닷가, 맨 앞 엄마 젖무덤 같은 무덤 두 개, 작디 작아도 동영상처럼 움직일 것 같은 상여행렬. 굽이굽이 돌아가 떠나가는 마지막 길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배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더불어 마지막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길도 함께라면 덜 적막하겠지요. 마지막 길이 철두철미 고립무원, 소외, 절대적 분리가 아님을 아는 이는 죽음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도 역시 죽음으로 인한 애잔한 슬픔이 저 밭길처럼 구불구불 흐릅니다. 하지만 슬픔과 설움, 고통이 이 그림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길인 줄 알면서도 저 길따라 함께 가보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봄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산천초목이 저렇게 삭아버리듯 우리 몸도 사그라드는 것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그 단순한 진리가 맹렬한 두려움으로 휘감기는 일없이 자연처럼 단순하게 당연하게 다가옵니다.
묘하게도 이 그림 속에는 죽음의 허무가 아니라 그리움이 출렁거립니다. 고요함과 움직임이 서로 부딪치는 일 없이 함께 너울거립니다. 옅은 황금빛으로 조용히 일렁거리는 바다는 마치 이 세상을 넘어 다른 세상을 비춰주고 있는 듯합니다. 번쩍이거나 짙지 않되 다른 빛이 함부로 넘어갈 수 없으면서도 차츰 차츰 갈색 대지를 물들일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저 세상, 저승 등으로 묘사하는 죽음 너머 세상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잊고 영원히 살기라도 할 것 같이 맹렬하게 이 지상의 부와 명예를 쌓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앞에 저 고요히 빛나는 바다는 말을 걸어옵니다. 이곳이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그림 맨앞에 있는 엄마젖 같은 무덤은 죽음이 곧 생명으로 이어짐을 말없이 한구석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죽음의 문화가, 죽음의 정신이 승리하고 있는 세상, 젊다기보다 어린 가수들의 비디오에는 폭력, 살인, 퇴폐적인 성이 찬양되고 어린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정신이 나가도록 매료됩니다.
공공연히 죽음의 정신을 숭상하는 이 시대에 참된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인식될 필요성이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죽음과 죽음을 부르는 폭력은 결코 그 자체로 추구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진짜 죽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찬양될 것이 아님은 조금만 눈돌리면 우리 주위에도 알아볼 표징들은 얼마든지 널려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삶이 바닥에 이른 이들, 감기처럼 흔한 암의 불확실함 앞에 떠는 사람들, 사업 몰락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시설로 보내진 아이들. 한 학교에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세월호 부모들. 이런 가슴저리는 표징도 거짓 죽음의 문화에 젖어든 이들의 굳은 가슴에 실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화 한복판에도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그 속에서 성장하고 기쁜 소식 전하고 수난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참생명이니까요
님의 탄생 우리의 생명
님의 죽음 우리의 생명
무엇을 두려워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