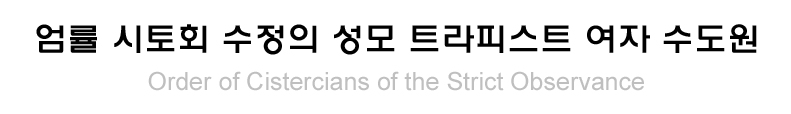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16년 7월의 말씀

열림이 곧 닫힘이요
닫힘이 곧 열림이네
저 그 앞에 앉아 머물고 싶습니다. 언젠가 석굴암을 찾았을 때 느낌이 마치 오늘의 느낌처럼 생생하게 피부를 건드립니다. 손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곳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앞에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불교라는 이웃 종교의 유명한 석불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끌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럼에도 팽팽함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손을 슥 들어올려 좀 더 다가오라고 손짓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불상인지 불상이 나인지 모를 정도로 그 안에 푹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신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 그 경계선을 자유로이 술렁술렁 넘나듭니다.
유럽의 수많은 조각과 그림들을 책에서 보았고, 그 앞에 서면 사람을 압도하는 엄청난 건물들 앞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건물들이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균형미와 세세함에까지 이르는 정교함, 어둠과 빛의 조화, 색의 찬란함 앞에서는 감동을 넘어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라고 갑작스레 애국, 민족주의 같은 것이 슬며시 고개를 쳐들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상과 피에타는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마음에 남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세기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굴암 본존불 같은 인물상은 어디서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치우친 감정일 수도 있겠으나, 성모님을 표현한 어떤 인물상에서도 “아, 정말 성모님이네.”라는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보면 꼭히 치우침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상은 이보다 더 한 것 같습니다.
인성 안에 깃든 신성, 신성 안에 깃든 인성은 어느 한쪽만을 표현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양쪽 모두를 한 모습 안에 담아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이제 하나 하나 음미해보기로 합시다. 조용히 닫혀진 입이 어느 순간에는 영원히 닫혀진 듯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조용히 열려 음악같은 한 소리가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꽉 닫혀진 입은 대체로 어떤 확고함 내지는 고집스럽움을 느끼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닫힘이 곧 열림이요 열림이 곧 닫힘이라고나 할까요. 날아갈 듯한 눈썹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최고의 초상화가 김 호석 화백은 초상화에서 눈썹이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다고까지 표현하였는데, 눈썹을 가리고 바라보면 화백의 말에 금방 동의하게 됩니다. 날아갈 듯한 눈썹에서부터 과도하게 크지 않으면서 쭉 뻗은 콧날로 연결되는 선에서 어쩌면 신성이 은근히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보면 반쯤 닫혀있는데 왠지 모든 것을 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묵상할 때 눈을 이렇게 반만 감기 시작한 것이 석굴암을 방문한 뒤부터였습니다.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졸음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잠이 오기도 쉽지만 쉽게 자신의 생각과 분심 속을 헤엄치고 다닐 수 있고, 눈을 뜨면 보이는 세계 속의 번잡스러움이 집중을 방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끊임없는 깨어있음을 동반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존불의 자세입니다. 바늘 끝 하나조차 더 들어갈 자리가 없을 듯한 완벽함과 한없는 편안함이 동시에 흘러나옵니다. 편안하기만 해서는 의로움에서 벗어나기 쉽고, 완벽하기만 해서는 온갖 사람들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옳고 바르고 좋은 것을 지향하는 것은 나의 완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와 바깥 세상을 위한 것임은 수도자는 한 시도 잊어서는 안될 사실이요, 인간 생명의 지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