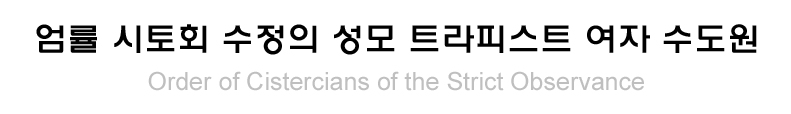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22년 1월의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느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려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여 주시며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습니다(창세 15,5-6). 고통의 의인 욥에게도 “아침 별들이 함께 환성을 지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제시간에 이끌어 낼 수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욥은 고백하지요. “주님,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욥 42,2). 캄캄한 하늘의 별은 단지 황홀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 안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시린 얼굴 위로 새삼 뜨겁고 놀라운 광경이 쏟아집니다. 두려움과 함께. “땅을 비추는 별들이 되어라!” 는 명령의 단추를 당신 손가락으로 단 한 번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씩 빚으시고 모서리의 구석구석을 씻으시어 가장 알맞은 제 위치에 별들을 걸어두셨군요. 별도 천사도 거짓말을 할 리가 없으니 별의 말을 따른 동방박사와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들판 동굴의 구유에 누운 아기”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루카 2,10). 하느님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경천(驚天)하고 동지(動地)할 일은 계속됩니다. 건너야 할 요르단 강 주변의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섬뜩하게 날을 세우고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뿌리에 닿아있다.”(루카 3,7-9). 살려면 지금 당장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네베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악한 길과 폭행에서 돌아섰습니다(요나 3,5-10).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요한의 소리를 들은 세리들과 군사들, 기대에 차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그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백성들의 행렬 맨 끝자락에 그분께서 서 계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차례를 기다립니다. 루카는 천연덕스럽게 전합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루카 3,21). 별빛보다 더 가벼우시니 하늘 위 하늘에 계셔야 하는 분께서 가장 낮은, 더구나 온갖 위선과 악의와 죄를 씻는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시다니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마르 1,1).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라고 만류하거나 행렬에서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정녕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구유에서 태어나고 스스로 “흠없는 죄인”이 되었던가요. 안절부절, 당혹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2코린 5,18.21).
세상과 인류의 온갖 죄를 짊어지시어 당신 것으로 만드시고 없애시는 예수님께서는 물살이 요동치는 죽음과도 같은 강의 깊은 심연까지 내려가시고 올라오셨습니다. 마른 땅처럼 물 위에 서시어 기도하셨습니다(루카 3,22).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쩌면 그 세리의 기도가(루카 18,9-13) 바로 예수님께서 이날 바치신 기도일까요?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 예수님의 기도 후에 새로운 창조가 한 처음처럼 일어납니다. 물은 갈라지고 하늘 궁창은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차갑고 냉혹한 하느님의 얼굴이 아니라, 언 땅의 어둠에 묻힌 씨앗을 싹트게 하는 따사로운 햇살 같으신 “아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그 얼굴을 보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입은” 새 인간임에도 여전히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눈먼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산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야만 합니다. 오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두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도 “나는 저 사람들과는 같지 않아”라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바리사이가 아니라 연약함과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죄인들과 친구”(루카 7,34)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 친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여 함께 걷는 우리의 일상이 “하느님 나라의 드러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너희는 나의 연인이고 나 또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세례 / 17세기 / 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