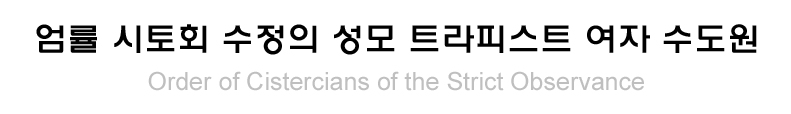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16년 2월의 말씀

“찬 미 하 라” 교종 프란치스코
년 6월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을 기억하시는지요? 거칠고 험한 산을 안개가 가득 덮어 신비와 두려움이 느껴지는 산 정상에 한 남자가 한 쪽 발을 올린 채 그 산보다 더 장엄한 자세로 서있는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그림의 자연은 아주 평범한 한국 농촌의 풍경입니다. 가을걷이마저 끝나 황량한 들판과 겨울강을 이렇듯 따뜻하게 김 호원 화백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도 저 들판에 서고 싶게 만듭니다.
이미 땅과 가까워진 억새 그늘 아래 쪼그리고 앉은 작은 여자아이와 새소리에 귀를 세우는 강아지 한 마리. 특별한 것, 멋있는 것 하나 없이도 멋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동물이 서로 품고, 서로에게 기대고, 그러면서도 각자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쳐내고 파헤치고 밀어낼 것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쓸 데 없으니 쓸어버리고 다른 좋은 것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긴 그대로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탐욕만을 목표로 모든 것들의 질서를 매겨, 자르고 파헤치고 없애버린 곳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이 그림에는 담겨있습니다. 사람이 자연 위에 우뚝 서있지도 않습니다. 자연과 사람은 이 푸른 지구별 위의 동료니까요. 만약 저 그림 한복판에 멋진 시멘트 건물 한 채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야 고요히 흐르는 강과 넉넉한 들녘 가운데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멋진 전원생활을 영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들녘의 숨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귀 밝은 이에게는 아파 우는 들녘의 울음소리마저 들릴 것입니다. 더구나 저 들녘을 깨끗이 밀어내고 아파트와 집들, 상가가 들어선다면 지금 우리를 감싸주는 그 평화의 고즈넉함은 결코 얻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저 아름다움을 발달이라는 목표를 위해 얼마나 많이 넘겨주었나요?
이제는 저 들녘의 숨소리, 우리 가슴 속에 짓눌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디 들녘뿐이겠습니까?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식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집단으로 내몰린 이들이 여기 저기 있건만 힘있는 언론과 정치인, 기업인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습니다. 약한 이들만이 서로 힘을 모아 어떻게든 이 소리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힘있는 이들의 눈에는 불순 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나봅니다. 이 소리마저 외면한다면 길가 돌멩이들마저 소리를 칠 것이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지 않을 리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 깊은 곳 저 들녘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 따뜻함이 없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음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 부드러움과 넉넉함이 흐르는 곳에는 옆 사람도 약한 사람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넉넉함을 잃고 시멘트 건물처럼 일자, 직선의 선만이 서로 높이 솟겠다고 경쟁하는 곳에서는 약한 이들과 더 약한 자연 속 동물, 식물들은 그 서슬 아래서 발디딜 곳조차 찾지를 못하게 됨을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분명하게 보아왔습니다.
저 억새처럼 한여름 태양 아래 그 강건함도 초겨울 바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부드럽게 물결치는 저 곡선의 음악이 우리 마음에 물결치는 날, 이웃집 담 너머 먹을거리 서로 나눠먹던 그 정겨움이 샛강의 졸졸거림처럼 흐르는 날, 이웃의 아픔에 내 마음을 보태 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날을 꿈꾸어봅니다. 교종 프란치스코의 “찬미하라”가 온세상의 교향곡으로 울려퍼지는 날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