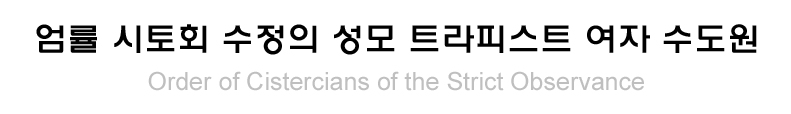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15년 12월의 말씀

인간이라는 그릇
그림에서 누가 보입니까? 사실 조르주 드 투라라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그림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를 그린 그림은 일반적으로 평하기를 저절로 고요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지나치게 멜랑꼬리(?)한 분위기가 퍽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예수님을 진짜 아기,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린 그림을 찾으려 하니 이 그림밖에 손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그림을 자꾸 보다보니 원래 지녔던 선입관은 사라지고 실핏줄 가득한 아기의 모습, 그 말랑말랑 연약한 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화가의 생애는 우리를 감동시킬 그런 점들은 찾기 어려운 듯 합니다. 자료가 명확하지는 않다 치더라도 어쨌든 평민 출신에서 결혼을 통해 작지만 귀족 칭호도 지니고 상당한 농지도 지녔다합니다. 그리고 농민에 대한 사려깊지 못한 대우로 가족 모두가 농민반란 때 맞아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인간의식의 새로운 면이 강조되는 바로크 시기에 유별나게 종교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인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심연이라 할까요. 이중성이라 할까요. 그 깊은 심연을 엿보는 것 같아 아찔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인간, 날 것의 인간,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가 동시에 하느님이시라는 이 깊은 신비 앞에 설 때는 더 아찔하겠지요! 이 사실이 신비로 자신의 몸과 정신과 영을 뚫고 다가오는 이는 복됩니다. 저 실핏줄 투명한 아기, 태어나 곧바로 천으로 감싸인 아기 안에서 생명의 신비가, 하느님의 신비가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아기가 하느님이시라면, 인간 모두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의 찬미를 받아 마땅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알아보지 못할 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도 진실이 됩니다. 하느님께 다가가고자 한다면 저 약하디 약한 인간, 쥐면 꺼질 듯, 약한 숨은 훅 불어꺼질 듯, 그렇게 약한 인간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끝없이 악해보이는 인간 안에도 그 하느님이 깃들어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밭의 가라지는 아직 뽑아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뽑으려다 내가 가라지인 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요.
생명의 신비, 사람의 신비, 아기의 신비, 아기예수님의 신비, 하느님의 신비, 약함의 신비, 악의 신비, 선의 신비는 인간이라는 하나의 그릇 안에 만납니다. 인간이라는 그릇 안으로 오시어 인간 조건의 모든 약함을 함께 지닌 하느님! 그 하느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불행, 악, 비참, 약함 또한 한없는 신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약하디 약한 인간이라는 그릇에 하느님이 담길 때, 동료 인간이 담길 때, 동료 피조물이 담길 때 인간은 참 인간이 됩니다.
<타자를 담을 때>
타자가 자신을
가득 채울 때 충만
타자와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참 나
자신에게서 미끄러져 나가면
타자가 들어와도 만날 이 없네
우리는 그릇
타자를 담을 때 온전해지는 그릇
자신을 비워 생겨난 곳
타자의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