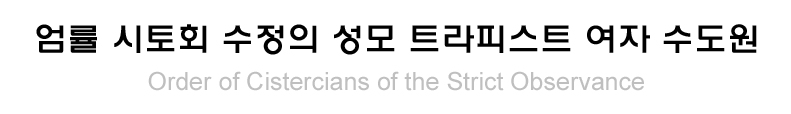트라피스트에서 보내는 2014년 6월의 말씀

세상의 빛과 어둠 I
옥
죄어 드는 두려움이 화면 가득 넘실거립니다. 크리스티안 롤프스가 그린 “포로”라는 그림입니다. 세상의 온갖 위기 중 아마 첫째 부류에 전쟁포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떤 취급을 당해도 호소할 곳 없는 불안한 처지, 죽음을 당한다 해도 저쪽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끝나 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인간의 모습이 너무도 리얼하게 묘사되어있습니다. 저 큰 눈 속으로 두려움의 시커먼 터널이 수십 킬로미터, 끝모르게 달리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짝 말라 뼈만 남은 몸과 광대뼈 불거진 얼굴은 굶주림으로 시달렸을 고통의 순간들이 절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의 큰 눈 속 담긴 그리움은 그대로 넘쳐 흘러 홍수로 밀려올 듯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을 바라보는 이는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살고싶지 않은 처절함을 견뎌내게 해주는 유일한 보루인 듯 합니다. 응답없는 상황, 나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렸는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은 그 자체로 인간을 옥죄는 괴물입니다. 쇠창살을 꽉 그러쥔 그의 손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괴물에 대한 분노를 어디에도 터트릴 길 없는 절박함으로 떨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고문으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림을 한참 보고 있자니 두 가지 점이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는 쇠창살의 틀이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의 몸과 쇠창살에 흰색이 빛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검은 배경과 짙은 고동색의 포로의 몸 색깔로 인해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옥죄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너무 강해 상당히 강렬한 테두리 흰색이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흰색은 화가가 검은 배경 속에 이 포로가 묻히지 않게 하고 싶어 택했던 수단일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화가에게 물어보지 않고서는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이지만, 작품은 보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창조의 해석을 할 수는 있지요. 저에게 이 흰빛은 희망의 빛으로 보입니다. 캄캄한 어둠과 쇠창살 속에서도 결코 스러지지 않는 빛 오히려 어둠 속이기에 더욱 선명한 빛 그러나 이 빛은 아직 그의 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지만 아직 그의 속은 캄캄함 뿐입니다. 심지어 쇠창살도 그가 빠져나가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여기서 이 감옥은 포로의 감옥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감옥, 이 시대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아직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침몰한 우리나라, 그 자체가 감옥이 아닐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탄식해마지 않는 돈과 발전에 대한 맹신은 이제 우리를 꽁꽁 묶는 쇠창살이 되고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기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발전도 돈도 유한한 법. 그런데 마치 발전 위에 발전을 쌓으면 어디까지라도 발전할 수 있는 듯 믿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이 세월호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배어들어 있습니다. 이 어둠의 검은 면 위를 감싸고 있는 이 빛을 볼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그림의 포로처럼 자신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쇠창살 속에서 망연자실 저 먼 곳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엄청난 희생을 헛되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악은 창조를 부르지 않고 파괴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가슴 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 사회를 만드는데 한몫을 했기에 누구나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손잡고 나설 때만 이 사회의 어둠 위에 떠오른 참빛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떠오릅니다. 외면하지 말고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시토회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